분신: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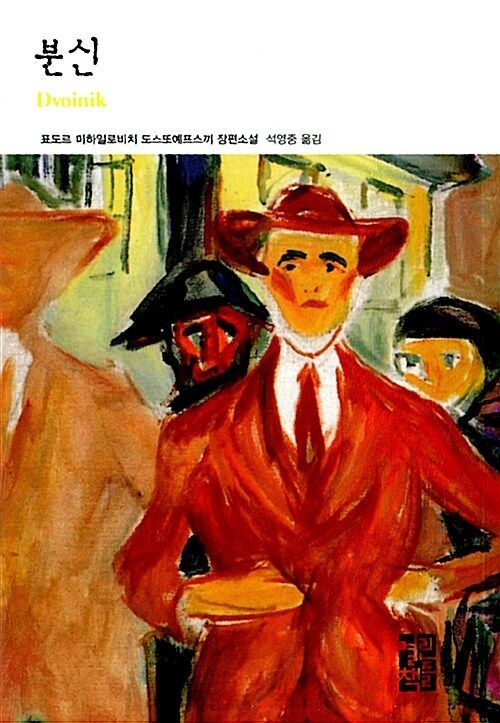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6969171
처음에는 이야기가 너무 고골 느낌이라고 생각했다. 싫진 않았다. 나는 고골이 좋으니까... 그런데 뒤로 갈수록 아니었다. 말투만 고골이지(사실 말투도 반만 고골이었다. 신비롭지도, 기괴하지도, 유머러스하지도 않아서), 내용은 카프카였고 다자이 오사무였다. 당시에는 이 책을 두고 지루하다는 평가를 했나본데, 오히려 그래서인지 나에게는 몰입하기 아주 쉬웠다. 이야기가 재밌고 흥미진진해서라기 보다, 오랫동안 도망치고 싶었던, 하지만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내 밑바닥의 두려움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소외’와 ‘자기혐오’ 말이다.
내가 언젠가 꿨던 이상한 꿈을 떠올려본다.
교실이었다. 당시 회사 동료, 전 회사 동료, 친구들 아무튼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모두 학생이 되어 뒤죽박죽 섞여있었다. 나는 거기서 사소한 실수를 했고, 순식간에 왕따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괴롭혔다. 나는 불합리한 취급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 내가 받은 괴롭힘을 배로 갚아주었다. 곧 나는 싸이코 취급을 받았다. 나와 친했던 사람들,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편지를 건네며 나를 포기했다. 모든것이 억울했고 화가 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다. 올것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왜 그랬을까? 정말 그 사람들이 불합리했던게 맞을까? 그런거 같았는데. 어쨌거나 나는 싸이코 왕따였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응당 이렇게 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조금 지났다. 학예회 비슷한 것이 열렸고, 나는 반 아이들과 스탠드에 앉아 구경했다. 나는 사람들 눈치를 봤지만, 사람들도 내 눈치를 봤다.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는 공연을 바라보았다.
왜 이런 꿈을 꿨을까? 내가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골랴드낀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싫어했다. 골랴드낀이 사람들을 붙잡고 자꾸만 같잖은 대화를 시도했던 것처럼, 나도 그럴듯한 말을 뱉기만 하면 고상한 성품 혹은 하여튼 내 안의 무언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곤 했다. 아니면 요조처럼 ‘익살꾼’ 흉내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말을 뱉고나서 느낀 것은 후회와 원망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다. 사람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눈치 없고 교만하며 자의식 과잉과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다. 나는 예의없고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나서기 좋아하지만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재수없는 인간이다. 나는 차라리 내 입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 눈알을 굴려 사람들을 보고 흉내냈다.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는게 두려웠다. 눈을 마주치면 꼭 내가 되다 말았다는 것을 들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니, 너무 우울한 이야기는 이쯤 하자. 아무튼 무서웠다는 뜻이다.
골랴드낀의 분신은 왜 나타났을까? 분신과 사람들은 골랴드낀을 왜 미워했을까? 이야기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왠지 알것도 같다. 골랴드낀은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고, 본인의 길이 “독자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처세술을 배우지 못했고 겉으로 화려하지도 않다지만,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전형적인 자의식 과잉의 모습이다(골랴드낀은 지하생활자의 전신임이 틀림없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멍청한 사람들 혹은 더러운 모사꾼이라며 미워하는데, 동시에 그 멍청한 사람들의 뻔뻔함을 질투하고 모사꾼이라는 사람들의 부와 권력에 대한 열등 의식이 깔려있다. 골랴드낀의 이런 생각들은 본인이 입을 아주 조금만 열어도 쉽게 드러난다. 그러니 설사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아둔하다고 해도 이 모든걸 눈치채지 못할리 없다. 사람들이 그를 미워한 것은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예민한 그가 ‘주변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눈치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리도 없다.
만약 골랴드낀이 정말 숨기고 싶었던 본인의 밑바닥을 전부 들켜버린 것 아닐까 하는 불안속에서 살아야만 했다면,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에 대한 증오,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 그래서 생기는 부끄러움, 그걸 극복해보고자 시도했던 온갖 꾸며내기들, 하지만 도저히 능력이 닿지 않는 상황, 사람들이 그런 나를 꿰뚫어보는 것 같은 느낌, 곧 모든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만 같은 불안... 그 살얼음판 위에서 매일을 살아야 했던 불쌍한 우리 주인공은, 압박감에 신경증이 도져 그냥 그 불안을 실현해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차라리 내가 나서서 전부 부숴 버린다면, 일어날 일이 그냥 일어나 버린다면, 더 이상 불안해 할 일도 없겠지... 그래서 골랴드낀은 모든 것을 끝장내기 위해 사람을 하나 보낸다. 누구보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본인을.
그래서 내 눈에 ‘분신’이란 말 그대로 자기 자신, 다만 자신을 파괴하는 자기 자신이다. 지하생활자가 스스로를 지하에 가뒀던 것처럼, 골랴드낀도(요조처럼) 스스로를 정신병원에 가뒀다. 나는 그들이 혐오스럽고 또 불쌍하고 또 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 너무 무섭다. 머리로는 안다, 그럴 일 없다는 것을, 내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렇게 잘 아는데도 문득문득 커다란 공포감이 올라온다면 도대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 더욱 이상한 것은 무서워 죽겠는데도 이런 책이 너무 재밌다는 것이다. 진짜 미친놈인가...
Member discussion